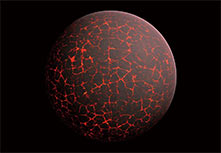Old but New: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한국의 명무(名舞)
에디터:유대란, 사진:신형덕
“우리는 김포공항을 떠날 때부터 어깨가 펴졌다가 다시 김포에 내리면서부터는 기가 죽는다.”
1960년대 이후 국악과 한국무용이 해외에 소개되고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을 무렵, 국악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농담이었다고 한다. 해외에 나가서는 박수 갈채를 받지만 국내에서는 천대받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근대화 이후 국내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선되고 있었지만 전통 예술 종사자를 천시하는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재인, 광대, 사당 등 직업 예술인들과 후예들은 주류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 근세까지도 천인 계급에 속했던 탓인지 개화기, 일제 식민시대, 해방과 서구화를 겪는 동안에도 그들은 현대적인 예술가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고 일부 예인들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잊혀지고 말았다. 1970년대 말에 들어서서 탈춤, 굿, 농악이 외국 무대에서 잇달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국내 공연 횟수도 점차 늘었으나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일부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초,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는 뜻깊은 기획에 착수했다. 장기간에 걸쳐 한국의 숨겨진 명무를 발굴하고 우리의 춤 예술을 널리 알리고자 한 기획이었다. 1982년 1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일보는 신문 지면과 무대공연을 통해 명무를 소개했다. ‘명무’ 기사는 1982년 1월에부터 1984년 2월까지 일간스포츠에 주 1회씩 연재되었고, 서울시립무용단의 주최로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에서 십여 차례 ‘명무’ 공연이 열렸다. 호응은 뜨거웠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1985년, 그간의 신문기사와 사진, 공연의 성과들을 묶은, 『한국의 명무』라는 이름을 단 책이 나왔다. 이 책은 107인의 명인들의 삶과 춤을 인상적인 사진과 더불어 담았다. 승무(僧舞), 살풀이, 굿거리춤, 민요춤, 소고춤, 무무(巫舞), 농악, 탈춤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 춤을 망라했다. 『한국의 명무』에 실린 사진은 ‘한국 보도사진의 역사’로 불리는 정범태 선생의 작품들이다. 1956년부터 『조선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에서 40여 년간 사진기자로 활동했던 그는 ‘걸어 다니는 국악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예술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50년대 초, 가깝게 지내던 처자의 전북 순창에 있는 고향집을 방문했다. 그 집은 수 대째 신을 모셔온 무당 집안이었다. 거기서 굿판을 보게 된 후 전국의 굿판과 춤판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 그가 『일간스포츠』에 재직 당시 동료였던 구희서 선생과 한국의 대표적 예인들을 취재한 것이 기사로, 그리고 책으로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