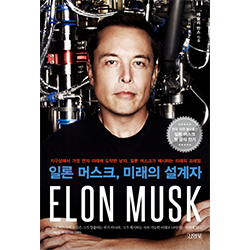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July·August, 2016
추억을 먹는 시간
Editor. 박소정
굳이 특기를 말하라고 하면 요리를 꼽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집밥을 기준으로 소수의 지인만 인정하는 ‘집밥 박 선생’이다.
요즘엔 향신료에 꽂혀 베란다에서 바질을 키우는데 바질 몇 잎을 똑 따서 요리할 때 요리가즘을 느낀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박찬일 지음, 푸른숲
‘밥 한번 먹자’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헤어질 때 ‘잘 가’라고만 하기엔 아쉬우니 의례적으로 덧붙이는 것인지, 밥 한 끼 먹으며 우애를 다지자는 것인지, 진실은 말한 자만이 알 것이다. 진실 여부는 제쳐두고, 예로부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배를 곯는 일이 흔하던 시절부터 먹을 것이 넘쳐나 먹방, 쿡방이 미디어를 장악하는 오늘날까지 ‘식사하셨습니까?’는 여전히 인사말로 통한다. 음식에 대한 본능은 우리가 씹고 맛보고 즐긴 음식에 얽힌 이야기까지 확장된다. 여기 두 남자가 전하는 음식에 얽힌 이야기는 지난날 맛보았던 음식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시간까지 떠오르게 한다.
요리 활동
바쁜 농가에서 태어나 자기가 먹을 음식은 자기가 만들어 먹어야 했던 저자는 생활교육공동체이자 식사공동체 ‘공룡’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한 공동체를 꾸려 나가며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저자는 요리법을 전수해주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소개하는 음식은 칼국수, 된장국, 약밥, 크림 파스타, 꼬꼬뱅, 유린기까지 장르를 종잡을 수 없지만, 한결같이 쉽고 유쾌한 수다로 풀어내 낯선 요리에도 우리가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동네 잔칫날이면 마주한 돼지고기 두루치기 이야기는 잊고 있던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집성촌에서 타성바지였던 그의 아버지는 주민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 동네의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잔칫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엄청난 양의 두루치기를 준비하는 것은 늘 그의 아버지 몫이었다. 큰 ‘다라이’에 적당한 크기로 썬 돼지고기와 대충 양념을 넣고 대파와 함께 버무리면 되는 단순한 요리였는데, 그 맛이 늘 일품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공동체를 위해 두루치기를 만들게 됐는데 쉬워 보이던 아버지의 요리를 막상 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먼저 들었다. 많은 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양념장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았던 탓이다. 고생 끝에 음식을 완성하고 나서야 그는 한숨 돌리며 ‘요리의 첫발은 함께 먹을 누군가를 책임질 만큼의 용기를 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며 아버지가 지녔던 삶의 무게 그리고 그가 낸 용기에 대해 돌이켜본다. 그는 요즘 미디어에 나오는 새하얀 앞치마를 입고 불 앞에서 씨름하는 멋진 셰프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려 요리하고, 함께 나눌 때의 기쁨을 느끼고, 요리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요리 하나하나에 추억을 간직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맛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졌다. 야비해지고 더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복합적인 존재로 변해갔다. 섹스가 번식이 아니라 사랑과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치사한 인간사의 대로망이 시작되었듯이 말이다. —본문 중
그가 맛을 기억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잡지사를 관두고 돌연 이탈리아로 요리 유학을 떠나고 돌아와 셰프로 유명해지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맛의 현대사의 한 장을 들춰보는 것 같다. 맛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는 예나 오늘날이나 매한가지이지만, 미디어의 영향인지 요즘 미식여행가의 원조 격인 그에게 사람들은 자문하기 일쑤다. 그럴 때 그는 우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터미널 근처 아무 국밥집에 들어가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우를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한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인 곳도 있다. 바로 맛의 고장 전라남도다. 남도의 맛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그는 아무리 족보 없는 터미널 근처의 밥집이라도 사람이 먹는 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갖추어져 있음을, 재개발된 어느 도시의 골목 안쪽 분식집이라도 젓갈과 밑반찬이 정성스럽게 깔려 대접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두부 예찬론도 인상적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백석이 국수를 놓고 지은 이 시를 두부에 견주어도 손색없다며, 단순하지만 깊은 맛의 두부를 찬양한다. 또한 하루키가 소개하는 두부를 맛있게 먹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방법(제대로 된 두부 가게에서 살 것, 사오면 곧바로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기, 그리고 그날 안에 먹기)을 소개하는데, 허무함이 드는 한편 마트에서 플라스틱 통 안에 차갑게 식어 있는 두부를 장바구니에 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부의 참맛을 보고 싶다. 늦기 전에 시장에서 나온 따끈한 두부 한 모를 사다가 다른 찬이나 간 없이 맛봐야겠다. 두부 자체의 고소하고, 심심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물우물 음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