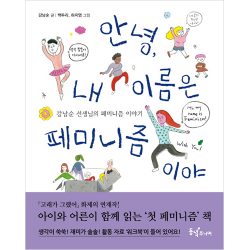Chaeg’s choice
책이 선택한 책
December, 2018
개인으로 살아남기
Editor. 김선주
읽고 싶은 책은 날로 늘어가는데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느린 독자. 작은 책방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책들을 수집 중.

Type&Press
요즘 어떤 독립출판물이 재밌는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나왔는지, 새롭게 발견할 만한 좋은 책은 없는지 틈틈이 책방과 SNS를 들락거리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몇몇 책방에서 동시에 강력히 추천하는 책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작가의 명성이나 자본에 상관없이 진짜 순수한 독자의 마음으로 추천되는 책을 알 수 있다는 게 소형 책방이 가진 큰 매력인데, 최근 몇 달 사이 알게 모르게 책방과 독자들의 인정을 받으며 2쇄까지 찍은 책이 있으니 바로 『피구왕 서영』이다. 수많은 책을 입고 받고 판매하는 책방지기들이 유난히 진심으로 팔고 싶어 하는 책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피구왕 서영』은 집단과 타자 속에서 한없이 쪼그라드는 개인에 관한 6개의 이야기를 묶은 단편소설집으로, 황유미 작가가 만든 가상의 1인 창작 스튜디오 ‘Type&Press’의 첫 책이기도 하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 애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분투는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치열했는지도 모른다. 학교라는 좁은 세계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1년의 생활이 결정되기도 하니까. 이 책의 첫 번째 단편이자 표제작인 「피구왕 서영」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초등학생 4학년인 이서영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아이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서영은 그러한 능력(?) 덕분에 교실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 구조를 단번에 파악한다. 서영은 전학 첫날 함께 피구를 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지의 무리와 어울리게 된다. 하지만 그 뒤로 번번이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은 서영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승부욕 강한 현지와 다른 팀이 되어 피구 시합을 할 때 팀의 승리와 현지의 승리 중 하나를 택하는 순간, 함께 놀 때 마음이 편한 친구지만 공공연한 왕따인 짝꿍 윤정과 마주치는 순간, 그 극단에 선 친구들이 대치하는 순간. 서영은 비록 마음은 불편해도 교실 내 안정된 입지를 보장해주는 현지와, 함께하면 즐겁지만 그로 인해 입지가 틀어질 수 있는 윤정 사이에서 계속된 고민에 빠진다. 도덕적인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막상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야, 너는 그걸 못 피하냐? 너 때문에 졌잖아.”
(···)주장은 삿대질해가며 패배의 원인을 ‘너’라는 2인칭으로, 한 명의 실수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었다. (···)서영은 역시 피곤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주장의 행동이 과한 것 같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주장이 얘기한 ‘너 때문에’에서 ‘너’가 자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작가는 이러한 유년 시절의 은근한 권력 갈등을 세심하게 관찰해 예리하게 그려낸다. 교실이라는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구를 잘해야 했던 서영이라는 개인은 너무도 소심하고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 개인을 결코 약하게만 그리는 것은 아니다. 서영이 ‘피구 노예’가 아니라 그저 친구와 즐겁게 노는 ‘피구왕’이 되기를 선택하듯 말이다. 우리는 늘 튀고 모난 부분 없이 기존의 집단에 잘 융화되려 애쓰지만, 개인의 행복이 늘 힘의 논리에 굴복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소설이 끝난 뒤의 이야기가 어떨지는 모른다. 윤정과 어울리며 똑같이 따돌림을 당했을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는 이서영, 친구들이 아는 이서영을 벗어나 자기만 아는 이서영으로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이 수많은 ‘타자’에 둘러싸인 이들에게 위안을 준다.
이밖에도 책에는 남아선호가정에서 살아가는 딸, 성인 여성이라는 틀에 맞춰 하이힐을 신는 여자, 직장 동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매일 까만 옷을 입는 여자 등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크고 작은 집단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현생의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들 틈에서 간혹 느껴지는 나의 고민과 피곤을 꿰뚫어 본 듯한 이들 이야기는 그래서 소설이 아닌 마치 실제의 것처럼 가깝고 선명하게 떠오른다.